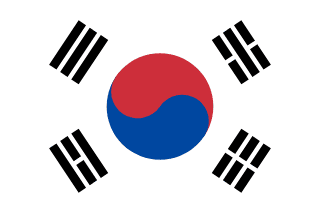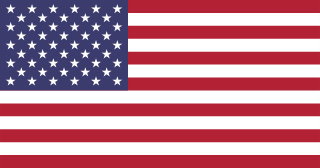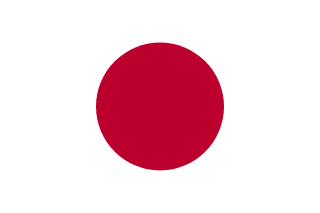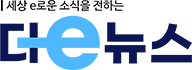아주 오랫동안 뜨겁던 여름날이 지나자마자 아침저녁으로 추운 날씨가 다가온다.
더운 여름날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몇 도나 올라가지 하고, 추운 겨울날에는 오늘은 얼마나 추운 날씨가 이어질까, 봄날이면 미세 먼지 농도는 얼마나 될까 하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일기예보를 보는 것이 아침 일상이 되었다.
그래도 지금은 잠시나마 가을인가 하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열고서 오늘의 온도와 날씨를 확인하지 않아도 궁금하지 않을 만큼 걱정이 적어졌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직장인이면 출근 준비를 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출근을 한다. 똑같을 수도 있고 거의 같을 수도 있는 매일의 행동이다.
낮에 만나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매일 새로울 수 없고 대부분은 그저 별일 없이 흘러가는 일상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도 별일 없었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별일 없는 삶이 큰 축복이라는 세상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도계가 영하 40도 아래로 내려갔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 이야기가 생각난다.
40도 아래로 떨어지면 그날 작업이 취소되니까.
평범한 농부였던 이반 슈호프는 독일 소련 전쟁 참전 당시 포로로 잡혔다가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되어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와 팔 년째 수감 중이다.
여느 때처럼 슈호프는 오전 5시 기상 시간에 맞춰 일어나려 하는데, 이상하게 몸에서 오한이 난다. 그러나 그는 밖에 나가 주어진 작업을 해야만 한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생선뼈와 썩은 양배추 잎사귀가 둥둥 떠 있는 아침식사와 750g이 채 안 되는 딱딱한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해질 때까지 영하 30°라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벽돌을 쌓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곡괭이를 휘두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슈호프는 그 일을 매우 열심히 해 내가면서 자신이 이룬 일에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며 그 일을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마치 자신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잊은 채 그 일에 몰두하며 장인 정신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며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슈호프는 무려 십 년을, 윤년으로 사흘이 더해져 3,653일을 그런 식으로 수용소에서 보낸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솔제니친의 작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 나오는 글이다.

영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한 장면
동녘 하늘이 푸르스름해지고 밝아오긴 했지만, 아직 수용소 주변은 어두컴컴하다. 뼈를 애는 가느다란 동풍이 뼈 속에 스며드는 것 같다. 점호를 하러 가는 순간만큼 괴로운 순간도 없을 것이다. 어둡고, 춥고, 배는 허기진 데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지내나 하고 생각하면 눈앞에 캄캄하다.
저녁이 되어 이때쯤 여기서 인원 점검을 받을 때 그다음 수용소 문을 통과하여 막사 안으로 돌아올 때 죄수들에게는 이때가 하루 중에서 가장 춥고 배고플 때이다. 지금 같은 때는 맹물 양배춧국이라 해도 뜨뜻한 국 한 그릇이 가뭄에 단비같이 간절한 것이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단숨에 들이켜게 된다. 이 한 그릇의 양배춧국이 지금의 그들에겐 자유보다 지금까지의 전 생애보다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슈호프는 남은 국물과 함께 양배추 건더기를 먹기 시작한다. 감자는 두 개의 국그릇 중에서 체자리의 국그릇에 하나 들어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게다가 얼어서 상한 것이었지만, 흐물흐물한 것이 달짝지근한 데가 있기도 하다. 생선 살은 거의 없고, 앙상한 등뼈만 보인다. 생선 지느러미와 뼈는 꼭꼭 씹어서 국물을 쪽쪽 빨아먹어야 한다. 뼈다귀 속에 든 국물은 자양분이 아주 많다. 이것을 깨끗이 처치하려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슈호프로서는 달리 서두를 일도 없다. 그에게 오늘은 명절과 다름없는 날이다. 점심도 두 몫을 먹었고, 저녁도 두 몫을 먹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다른 일을 뒤로 좀 미룬다고 해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자, 오장육부가 요동을 치며 반긴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서 죄수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슈호프는 모든 불평불만을 잊어버린다. 기나긴 형기에 대해서나, 기나긴 하루의 작업에 대해서나, 이번 주 일요일은 다시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나, 아무 불평이 없는 것이다. 그래. 한번 견뎌보자, 하느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테지.
슈호프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 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정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쌓기도 했다. 줄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체자리 대신 순번을 맡아주고 많은 벌이를 했으며, 잎담배도 사지 않았는가. 그리고 찌뿌드드하던 몸도 이젠 씻은 듯이 다 나았다.
눈앞이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위의 글에 나오는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의 모습은 옛날 군대에서 데자뷔 같기도 하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에게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슈호프처럼 수용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현대인의 일상은 거대한 수용소 안에서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본다.
더하고 덜 함의 차이가 있고 일체유심조라 생각하기 나름 일 수도 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일어난 소소한 일상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번 따분하고 싫증 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별일 없이 흘러가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된다.
솔제니친의 위 소설을 읽다가 보면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글도 생각난다.
솔제니친은 이반 데니소비치였다면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다. 러시안이라 그런 지 같은 이반이다.
아울러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파생된 영화 이키루(산다는 것 :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와 영화 리빙 : 어떤 인생도 연결되어 떠 올라온다.

영화 '리빙: 어떤 인생' 포스터
매일 출근하여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적당히 직장 생활을 하며 세월을 보내던 이반 일리치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되는 이야기다.
이반 일리치가 살아온 삶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한 모습처럼 지극히 평범하며 일상적이다.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중산층으로 살아가던 이반 일리치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온 죽음을 격렬히 거부한다.
이반 일리치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법을 찾고,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으려 했지만 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과연 옳았는지, 진정으로 행복했는지.
병이 악화될수록 이반은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진다.
아내와 딸은 그의 병을 귀찮아하고, 동료들은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한다.
유일하게 그를 진심으로 돌보는 건 하인 게라심뿐이다.
게라심의 순수한 연민과 사랑을 통해 이반은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반 일리치가 죽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는 무언가 약간의 안도감 같은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는 누가 승진할 것인가에 관심이 가고 상가에 직접 문상을 갈 것인가. 부조는 얼마나 할 것인가를 계산한다. 그의 죽음은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듯하다. 마치 죽음은 이반 일리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항일 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듯이.
내 카톡에도 단톡방이 몇 개 있다. 10여 명 있는 곳, 20여 명 있는 곳, 50여 명 있는 곳 등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있는 방이라 그런 지 방마다 먼저 가버린 사람들이 1~2 명씩 있다. 한 줄이라도 인사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부고가 뜨면 모두가 한 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잠시 분위기가 썰렁한 바람이 지나고 나면 가버린 사람은 가버렸고 언제 그랬나듯이 또 남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가버린 사람도 뭐 대단한 것을 남긴 것도 없고 한때는 그들도 무언가 의미 있는 큰일도 했지만 가고 나면 그뿐 한 해 두해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진짜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한 사람씩 사라지고 있고 남은 사람들은 단톡방 화면을 보다가 생각만 가끔 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다.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도 그렇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에서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그 순간에 충실하게 즐기다가 가면 그뿐 소소하게 작은 일상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에는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