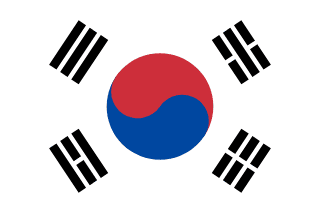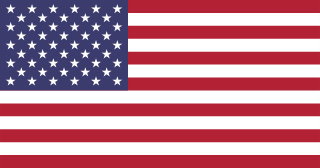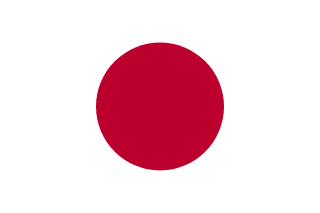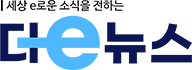나는 고두밥을 좋아한다. 고두밥은 아주 고들고들하게 지은 된밥이다. 어릴 적 할머니는 고두밥을 자주 지으셨다. 할머니가 고두밥을 지으시면 제삿날이 가까웠다. 제사에 사용할 감주(식혜)와 술을 빚기 위해 고두밥을 찌기 때문이다.
4대 봉제사와 함께 묘사라고 부르는 시제(時祭)에 명절 차례까지 보태면 달마다 제삿날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감주와 술을 빚기 위해 고두밥을 지으셨다. 된밥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고향 집 부뚜막에서 얻어먹은 할머니표 고두밥의 고소한 맛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당시 할머니의 ‘고된 노동’을 알지 못했다.

고두밥은 감주와 술의 발효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고두밥을 만들려면 쌀이나 찹쌀을 잘 씻어 하룻밤 정도 불려야 한다. 이어 1~2시간 정도 물기를 빼고 찜통이나 시루에서 증기로 쪄내면 고두밥이 된다. 고두밥에 엿질금(엿기름)과 누룩을 물과 함께 잘 섞어 버무린 다음 단지에 넣어 발효시키면 감주와 술이 된다. 이런 힘든 노동을 할머니는 달마다 하신 것이다.
할머니가 빚은 술은 불그스레한 색이 감돌았다. 찹쌀로 빚은 술, 우리 집안의 술, 가양주였다. 하지만 쌀이 모자라 혼·분식을 강제하던 60~70년대에 정부는 쌀로 술 빚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할머니도 밀주 단속반이 출몰하면 마을 주변 솔밭에 술 단지를 숨기거나 마당에 땅을 파고 감췄다. 당시 단속반의 행위는 매우 폭력적이었다. 단속에 걸리면 술 단지를 몽둥이로 깨뜨렸다.
하지만 우리 집에선 더 이상 할머니가 빚으시던 가양주를 맛볼 수 없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술 빚기를 잇지 않으면서 맥이 끊겼다. 어머니의 친정, 나의 외가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집안인 반면 친가는 말술도 사양하지 않는 두주불사(斗酒不辭)의 주량을 자랑했다. 선친의 술주정에 어머니는 언선시럽다(지긋지긋하다/경상도 방언)며 술 빚기를 거부하셨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빚으시던 술맛과 흡사한 술을 수년 전 다시 맛보았다. 성주 ‘한개마을’에서 자당(慈堂)을 모시고 사는 ‘사이비 농부’-그는 자칭 ‘문화 농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이수인이 붉은빛이 감도는 찹쌀술을 만드는 게 아닌가.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다. 어머니한테 전수한 기술이었다.
그 술맛을 못잊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 설을 앞두고 찹쌀 한 말로 술을 담갔다. 한개마을 월봉정에서 방앗간에서 쪄온 고두밥과 누룩을 섞고 직접 버무려 단지에 넣는 체험까지 했다. 그는 재주가 좋았다. 찹쌀 청주만 아니라 소주와 식초까지 만들었다. 청주를 주변 사람들에게 설 선물로 나눠주니 모두가 좋아했다.
친구 이수인이 담가준 술이 동난 터여서 그가 다시 술을 담그게 할 묘안이 필요했다. 우연을 가장해 술자리를 가졌다. 술이 얼큰해질 무렵, 요즘 막걸리와 소주 등 모든 술이 너무 달다고 투덜댔다. 해창막걸리, 송명섭막걸리 등 전국에서 비싸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막걸리 이름을 주워섬겼다. 이어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까지 먹어본 술 중에서 당신이 담가준 술이 가장 맛있었다”고 꼬드겼다. 대작(對酌)에서 시작해 수작(酬酌)으로 넘어갈 즈음이었다, 칭찬은 그를 춤추게 했다.
대번에 넘어왔다. 술을 담그겠다고 했다. 그런데 술기운 탓인지 갈수록 판이 커졌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처럼 말을 잇다보니 어느새 지인 100명을 모아 걸판지게 한번 놀자는 계획으로 발전했다. ‘수작결의’, 술자리 결의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술을 담그고, 담근 술은 성주 포천계곡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6월 초 성주 한개마을 여동서당에서 벌인 100명 초청 술잔치의 전말이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제사를 받들고,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다. 접빈객에 가양주가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요즘 가양주의 자리를 소주와 맥주, 양주가 대체하고 있다. 똑같은 술맛에 입맛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데도 구미가 당기는 술이 없다. 특히 막걸리가 그렇다. 만나면 즐거운 술친구와 함께 가양주를 마시는 호사를 꿈꾸며 이렇게 외치고 싶다. “마누라! 고두밥 좀 찌소”

언론인 조영창